

(승무원 방송)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세요.” (객실의 단원고 아이들) “네”
갑자기 배가 기울었어도 누구 하나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른들 말만 잘 따르면 살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했다. 승무원의 지시대로 구명조끼를 입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면 해경이 와서 구해줄 거라고 믿었다.
배가 점점 기울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의지할 수 있었다.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를 지켜주자며 구명조끼의 끈도 서로 묶었다. 구명조끼가 없어 불안해 하는 옆 친구에게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건네줬다. “내 건 또 가져오면 된다”며 아무렇지 않은 내색을 했다.
인근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 두라에이스호와 드레곤에이스호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교신을 받고 사고 해역으로 다가왔다. 대형 유조선이라 근접 거리로 접근은 어려웠지만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면 구조할 준비를 갖추고 대기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배가 점점 기울어 곧 침몰할 것처럼 보이는데도 갑판으로 피신하는 승객들이 안 보였다. 갑판에 묶어둔 컨테이너는 배가 기울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로 떨어졌다.
곧이어 해경 헬기가 도착했다. 객실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제 구조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 세월호에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이 계속됐다. 배는 더욱 기울었다. 출렁이는 바닷 물결이 눈높이로 올라왔다. 침몰하는 게 분명했다. 엄마, 아빠 생각이 났다. 동생 생각도 났다.
승무원의 지시대로 그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크게 밀려왔다. 갑판으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60도 이상 기울어진 배에서 한 발 한 발 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복도도 좁고 아이들이 여기저기 엉켜있어 뛰쳐나갈 수도 없었다. 머리 위에서는 헬기 소리가 요란했지만 구조대는 들어오지 않았다.
9시30분경 해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비정이 조타실로 접근했다.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 경비정으로 옮겨탔다. 미리 조타실로 대피해 있던 세월호 선박직 직원들이었다. 승객을 책임져야 할 세월호 선장은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탈출했다.
가만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인 승객들은 갑판 난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헬기가 이들을 구했다.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도 있었다. 긴급 전파를 받고 출동한 진도 어민들도 어선을 끌고와 바다로 뛰어든 승객들을 구했다.
배 안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마지막 메시지 발신 시각은 16일 오전 10시 17분.
왼쪽으로 기운 세월호는 완전히 뒤집어진 채 선수 바닥 일부만 수면 위로 내놓고 침몰했다.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나섰던 단원고 2학년 학생 등 세월호 승객 290여 명은 침몰하는 세월호와 함께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 갇혔다.
어린 승객을 버리고 누구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비상연락망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하게 출동한 어민들 만도 못해 보였던 해경. 결국 선장과 선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기 힘든 길로 몰아넣고 말았다.
가족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아이들을 수장한 것이라고 가슴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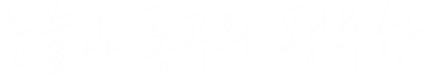
결국 이 정부는 실종자 중 단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국가냐”고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탄했다.
수면 위로 나와있는 세월호 선수 바닥은 아이들이 아직 배 안에 살아있다고 보내는 신호 같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더딘 구조에 분통을 터뜨렸다. 1분1초가 아까웠던 16일과 17일 사이, 정부는 잠수사 500여 명, 항공기 20여대, 선박 100여척을 동원해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해경은 수중수색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실력있는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를 돕겠다고 나섰으나 해경은 이들을 막았다.
해경의 통제속에 구조활동을 민간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독점했다. 해경은 침몰한 세월호를 건져내라는 ‘구난명령’을 청해진해운에 16일 내렸고, 청해진해운은 17일 언딘과 구난계약을 맺었다.
승객들이 침몰한 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민간과 군의 잠수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사람을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근 양식장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배를 인양하라는 명령을 맨 먼저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해경은 구조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을까? 그렇지 않다. 전국에 서른 곳이 넘는 구난업체가 있고, 진도와 가까운 목포 등에만 6곳의 구난업체가 있다. 해경 청장은 선박 사고 시 이들 업체에 구조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조본부장인 해경청창은 이번에 어느 업체에도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 끼운 것이다.
16일 사고 발생 후 해경과 정부의 대응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어두운 그림자마저 보인다. 해경과 해양구조협회와 언딘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드러났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목숨을 구해야 할 국가는 없었고, 해경이 민간업체의 비지니스를 독점적으로 보장해주는 듯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뒤에서 주판알을 튕긴 사람들이 있었던 셈이다.
참담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다.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시각, 승객의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과적이 드러날까봐 화물 적재량을 조작했다.
승객의 안전보다 돈이 먼저였던 세월호는 평소에도 화물을 과적하고 다녔다. 접대비로 1년에 6천만원을 쓴 청해진해운은 선원교육에는 고작 54만원을 투자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수명이 다 한 배를 수입해 와 인천과 제주를 오갈 수 있었던 건 정부의 규제완화 덕분이었다. 출항 전 점검을 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서류로 모든 점검을 하고 안전하다고 했다.
세월호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